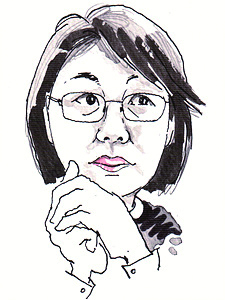| |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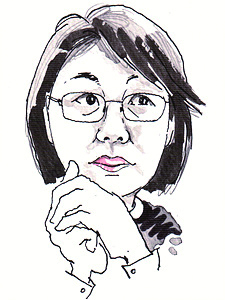 | |
| |
| |
| |  | |
| |
| |
‘폭력의 미학’이란 말은 어폐가 있다. 폭력은 크거나 작거나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. 하지만‘누아르’ 장르의 영화를 볼 때면 이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. 정당하진 않지만 명분이 있기에 아름다울 순 있다. ‘검은’이라는 의미를 가진 ‘누아르(noir)’라는 말 그대로 어둡고 대비가 강한 조명과 음울한 색채, 냉혹한 범죄자들의 세계를 묘사한 작품들은 세계대전 이후 인간성에 대한 허무주의를 담아낸 사회심리학적 반영으로 해석되었고, 이후 ‘홍콩 누아르’나 ‘한국형 누아르’처럼 파생되는 장르를 만들어 낼 정도로 계속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.
한국 누아르의 대표작이라는 <신세계>를 연출한 박훈정 감독의 신작 <낙원의 밤>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장르적 재미를 기대하는 관객들이 많았을 터이다.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작품은 누아르 특유의 빛과 색감의 화면만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다.
종종 폭력조직의 일대기는 한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또 다른 역사로도 읽힌다. 코폴라 감독의 <대부>와 두기봉 감독의 <흑사회>가 대표적이다. 한국 누아르에는 한국 사회가 그 동안 겪었던 집단과 집단 혹은 집단과 개인 간의 갈등과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지점이 생기는 것이다. <낙원의 밤>은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다. 아무리 봐도 그 장소가 대한민국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. 폭력조직은 의리도 금전도 추구하지 않고, 경찰은 방관자처럼 지켜보기만 한다. 집단의 존재 의미도, 명분도 없다. 작품이 디디고 선 현실의 콘텍스트, 그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다. 그렇다고 <존 윅>이나 <킬 빌>처럼 완벽한 가상 세계를 구축하여 액션이 주는 오락성을 끌어올린 것도 아닌데, <택시 드라이버>나 <무간도>처럼 사회심리학적 해석이 가능한 핍진성(逼眞性)을 찾아볼 수 없다.
이 영화는 유사한 감성의 영화 <소나티네>의 분위기를 애써 따라하지만, 입체적이기에 매력을 갖춘 캐릭터가 없으니 그 또한 힘들다. 목적을 잃어버린 수동적인 주인공, 낡고 평면적인 악역, 공감을 얻지 못하는 유머 코드, 계속적으로 늘어지는 액션 타이밍과 쓸데없이 수다스런 가짜 폭력배들로 인해 남는 것은 오로지 공허한 폭력의 이미지뿐. 잊고 있었는데 잘 만든 폭력의 비장미란 역시 어렵다. 독한 재료일수록 정교하고 세심하게 놓여야 했다. 아쉽다.
김세진 /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로그래머